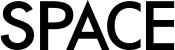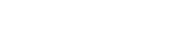「SPACE(공간)」 2024년 10월호 (통권 683호)


‘일본 아방가르드 건축의 3세대들’ 스틸컷 Screenshot from NAVER TV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는 제16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9월 5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됐다. 건축과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주제로, 개막작 ‘래디컬 랜드스케이프’(2022)를 포함해 총 여섯 개 섹션의 작품 32편이 아트하우스 모모와 네이버TV에서 상영됐다. 올해 영화제에는 특별히 ‘마스터&마스터피스 스페셜: J-아키텍처’ 섹션이 꾸려졌다. 지난 3월 야마모토 리켄이 2024 프리츠커상 수상자로 호명되면서 일본은 역대 가장 많은 프리츠커상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로 올라섰다. 일본 건축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가치는 무엇일까? ‘마스터&마스터피스 스페셜: J-아키텍처’ 섹션은 1989년부터 2023년을 아우르는 작품 다섯 편을 통해 국제 건축계가 주목하는 일본 건축의 어제와 오늘을 들여다보았다. 그중 백미는 마이클 블랙우드 감독의 ‘일본 아방가르드 건축의 3세대들’(1989)이다. 영화는 단게 겐조(1913~2005)부터 시노하라 가즈오(1925~2006)와 마키 후미히코(1928~2024), 이소자키 아라타(1931~2022), 안도 다다오(1941~), 이토 도요(1941~), 하세가와 이츠코(1941~)로 이어지는 ‘아방가르드 건축가’의 계보를 탐구한다. 일본 건축의 황금기를 빛낸 이 일곱 건축가는 일본의 전통과 과학 기술 및 현대적 소재를 융합한 혁신가들이다. 전통과 모더니즘, 자연과 첨단 기술에 대한 개개인의 태도는 다양하지만 세대를 가로질러 서로의 건축에 말을 걸고, 영항을 끼치고, 끊임없이 자신의 세계를 깨며 나아가는 거장의 자취를 찬찬히 따라 살필 수 있었다. 시대를 풍미한 건축가의 젊은 시절 모습과 당시 작품 세계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재미다. 반면 ‘현재를 다루는 법: 일본 건축의 오늘’(2022)은 바로 지금, 현세대에서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고 있는 일본 신진 건축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영화는 작가주의에서 벗어나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서 작업을 펼치는 건축가를 주목한다. 오늘날 제한된 자원과 새롭게 떠오른 재료, 도시에 대한 생태적·사회적 접근 방식을 원동력으로 일본 건축계에 신선한 힘을 불어넣고 있는 실무자들이다. 이들의 활동은 이전 세대에서 간과되어온 건축의 역할과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할 긴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상기시킨다. 한편 ‘비욘드 - 한국 단편영화와 건축’ 섹션에서는 ‘새들이 사는 마을’(2023), ‘반차’(2016) 등의 한국 단편영화에서 건축적 화두를 찾았다. 가령 재개발로 삶의 기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거나 아파트 건설 현장이 배경이 되는 영화들은 건축적 시각으로 한국 사회와 영화를 바라보는 창구가 되어준다. 이외에도 건축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예술적 미학의 관점으로 건축을 다시 바라보고, 예술을 담는 플랫폼으로서의 건축을 부각하는 ‘스페셜 섹션: 건축, 예술과 플랫폼’ 섹션이 마련됐다. ‘리처드 워튼: 건축의 시간’(2022)은 사진작가 리처드 워튼의 렌즈를 통해 많은 건축 유산이 위치하며 2021년 유네스코 디자인 도시로 지정된 도시인 뉴질랜드 황가누이를 비춘다. 황가누이의 50년을 촘촘히 기록한 워튼의 사진은 뉴질랜드 건축 유산의 기능적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도시의 독특한 시기를 드러낸다. 11일간의 행사 기간에는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 게스트 토크 등의 부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에서는 ‘AI 시대, 건축을 담는 플랫폼은?’을 주제로, 최신 기술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가’로서 건축가의 자질에 대해 건축 및 각 분야 전문가와 관객이 함께 논의를 나눴다.

▲ SPACE, 스페이스, 공간
ⓒ VMSPAC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