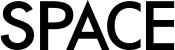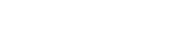「SPACE(공간)」 2023년 10월호 (통권 671호)

『건축의 눈으로 본 동아시아 영화의 미』 출판 기념 강연회 모습 ©Kim Minhyung
영화계에서 아시아가 주목받게 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초기에 영화의 기준은 서구였기에, 아시아 영화는 자신의 고유한 문화에 서구 영화의 연출을 섞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최근 아모레퍼시픽재단의 ‘아시아의 미(美)’ 연구지원 사업을 통해 『건축의 눈으로 본 동아시아 영화의 미』를 출간한 최효식(한양여자대학교 교수)은 8월 24일 서울 아모레퍼시픽 사옥에서 열린 강연에서 서구와 아시아의 영화가 주고받은 영향을 살펴보며 편집과 장면 연출, 구도에서 드러나는 표현 속 건축물과 공간을 어떻게 담아내는지를 짚어냈다. 강연에서는 감독 구로사와 아키라의 여러 작품을 통해 사무라이 액션과 서부극 결투 장면의 공간 배치를 비교하기도 하고,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촬영 앵글을 교차 적용해 새로운 영상미를 구축한 흐름을 살폈다. 오즈 야스지로가 만든 ‘동경 이야기’(1953)의 경우, 좌식 생활권과 입식 생활권에 따라 영화에 반영된 앵글 차이를 설명했다. 한편 모더니즘 양식이 한국에 자리 잡은 후, ‘여고괴담’(1988)의 감독이 주목한 것은 장식이 없는 하얀 학교 벽이다. 최효식은 절제된 배경 연출과 인물에 집중한 영화적 특징이 장르영화의 발전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올드보이’(2003)와 ‘장화, 홍련’(2003)에서는 현실성을 배제한 환상적 공간을 통해 고유한 영화의 서사를 만들어냈다고 평했다. 하지만 점차 지역적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동아시아 영화만의 미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이에 최효식은 축적의 시간을 거치며 꾸준히 쌓여온 결과가 결국 지역성으로 나타날 것이라 답하며 강연을 마쳤다. (김민형 학생기자)

▲ SPACE, 스페이스, 공간
ⓒ VMSPAC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